안녕하세요. 우스토립니다 :D
오랜만에 추천하고 싶은 책과 함께 하게 됐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 시간 책을 멀리하다가
반 년전부터인가 다시 책을 가까이두고
무언가에 홀린 듯 다독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 속에서 유독 이 책은 누군가에게든
그들 곁에서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조심스레 추천해봅니다 :)
한정원님의 《시와 산책》

시와 산책은 짧은 시를 인용하여 작가가 느낀 혹은 경험했던 일들을 수필의 형식으로 따뜻하게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건방지지만 그 위에 제가 보고 느낀 점 역시 얹어 소개해볼까합니다. . 부디 이해해주시길 :D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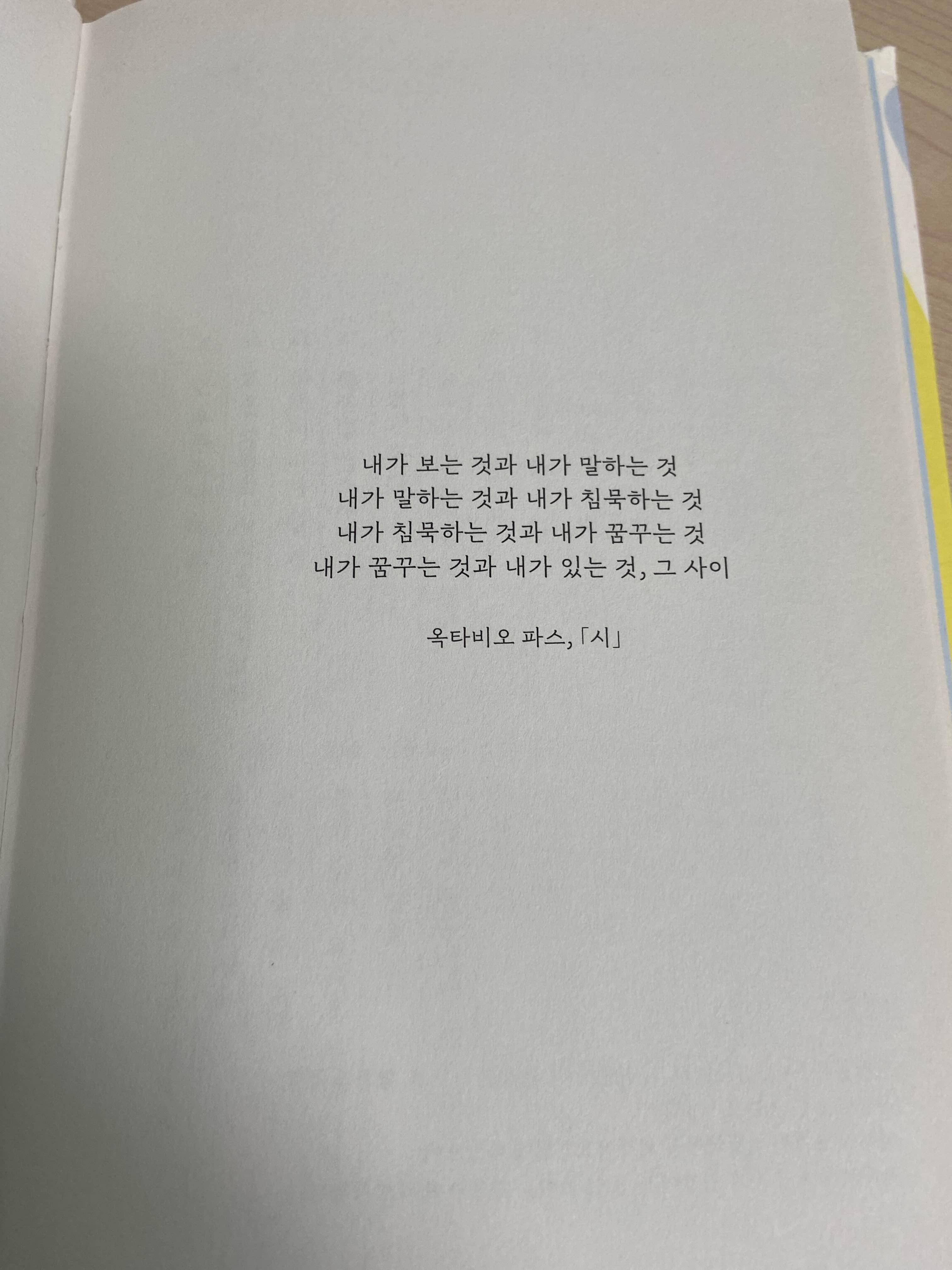
한정원님의 시와 산책은 위 이미지의 시와 함께 시작합니다.
'~와 함께'라는 말과 퍽 잘 어울리는 '~의 사이'
시와 '함께' 산책을 한다. 시와 산책의 사이에 함께한다..
책의 말미에 나오는 말인데, "걷고 있어요?, 같이 걸어요."
모든 말이 이런 말이면 어떨까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이 유독 따뜻하게 제 곁에서 머물러 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작가는 우리 주변의 약한 존재, 혹은 소외받은 존재들에게 따뜻하게 '함께' 있어주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가의 주인 없는 고양이들,
소록도의 한센인들,
정신병동의 이름 모를 이들,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들,
심지어 이미 떨어져 버린 작고 아름다운 꽃잎들까지도 밟지 않으려고 춤을 추듯 걸었다는 작가의 마음이 너무도 고와 뭉클해졌습니다.
-산책이 시가 될 때
인디언 소녀가 친구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는 길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지나서 바다 반대편 고사목 쪽으로 와.일렁이는 가는 물줄기가 보이면, 푸른 나무에 둘러싸일 때까지 상류로 올라와. 해가 지는 쪽으로 물길을 따라오면 평평하고 탁 트인 땅이 나오는 데, 거기가 나의 집이야.
한편의 시를 보는 듯한 목적지에 대한 설명,
친구의 집에 닿을 즈음이면 시 한 편을 읽은 셈이라는 작가의 말.
요즈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정선의 골짜기며,
친구들이 있는 서울, 세종, 구미 등등
장거리 운전이 많은 저에게 걱정스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단지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길을 주시하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는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때론 신나는 노래, 때론 잔잔한 노래들과의
시간을 담고 기대와 환희 속에 그들에게 닿았을 즈음이면
역시 한 편의 시를 읽은 셈이 아닐까합니다.
당신이라는 목적지만을 찍어 단숨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모든 소소한 고단함과 아름다움을 거쳐 그것들의 총합이
당신을 만나게 하는 것.
그 시간들 조차 당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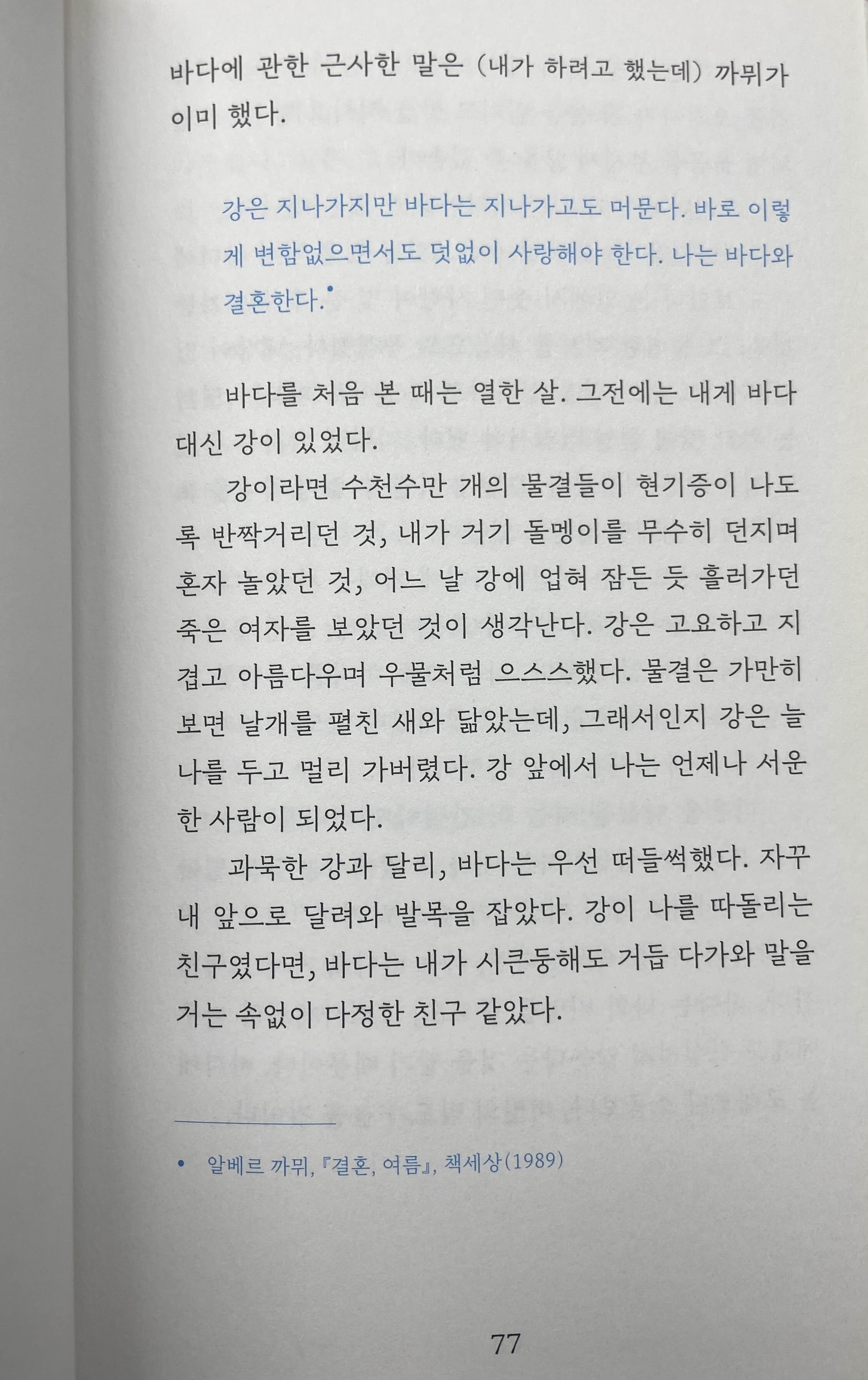
강은 지나가지만 바다는 지나가고도 머문다.
바로 이렇게 변함없으면서도 덧없이 사랑해야 한다.
나는 바다와 결혼한다.
계속해서 지나가는 과묵한 강,
내 앞으로 달려와 발목을 잡아 같이 놀자는 바다,
누구나 같은 강과 바다를 보면서 어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의미를 지어주어
곁에 두고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처럼 어릴 적 바다에서 시체를 본 사람이 보는 바다와
어릴 적 아버지가 작은 튜브에 올라 먼 바다에서 문어를 잡아오시는 것을 본 바다는
같은 느낌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바다를 미워할 수 없어합니다.
- 진실은 차츰 눈부셔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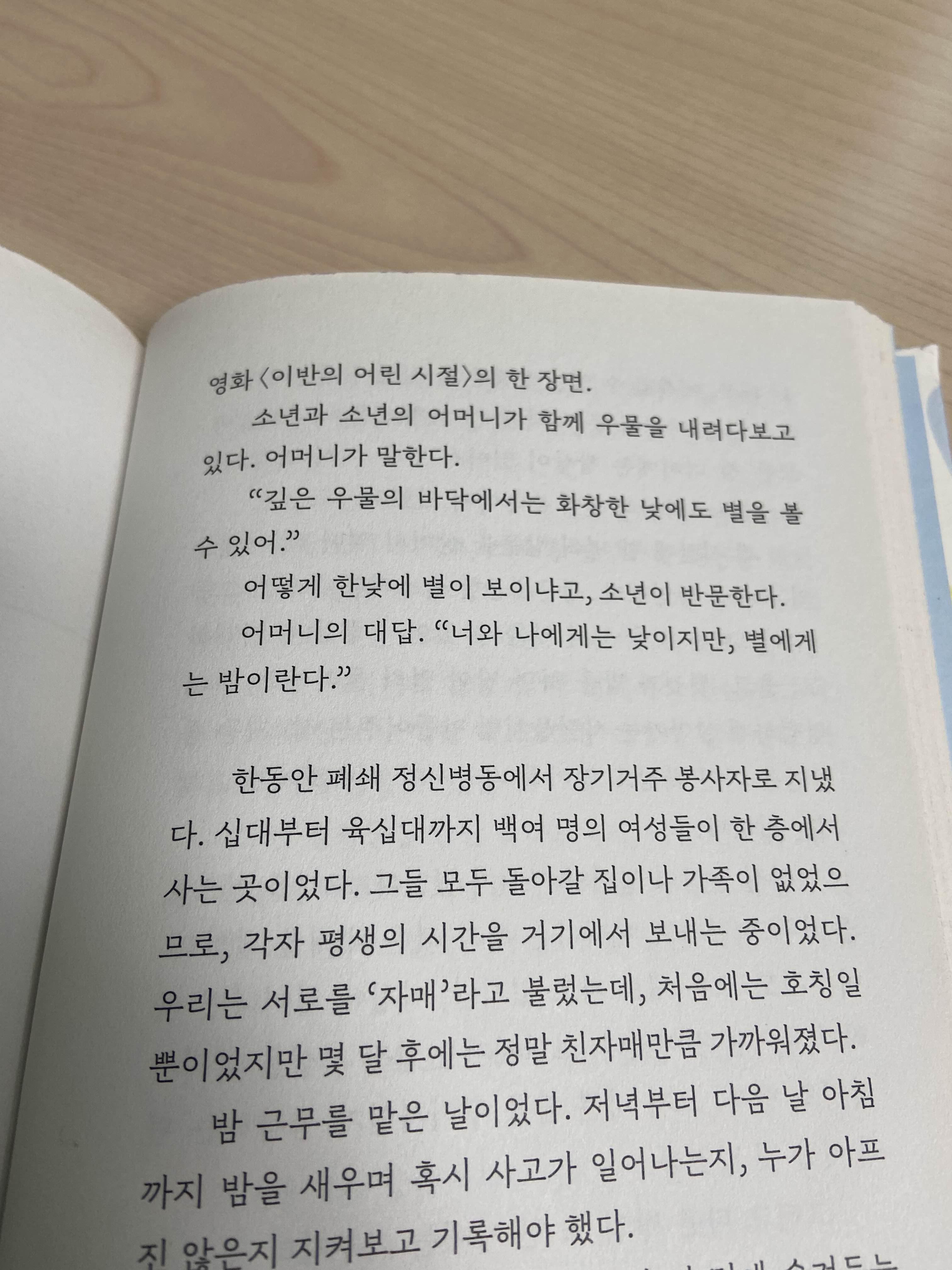
정신병동 안의 어떤 이가 편히 누워 잠들지 못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본 작가는 묻습니다.
왜, 누워서 잠들지 않냐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불 위에 못이 있어 그렇다고.
못이 보이는 거짓과
못이 보이지 않는 진실
혹은
못이 보이는 진실과
못이 보이지 않는 거짓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두 다 각자에겐 진실인 것을..
작가는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의 진실과 그녀 편에서의 진실이 다를 때,
그것은 어떻게 전해져야 아무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들이 뭘까 한참을 고르다가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는 작가.
작가 본인에겐 낮이고 그녀에게는 밤인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잠이 들었고
작가는 그녀를 바로 눞혀 이불을 덮어주었다 합니다.
베개와 이불 위에 자국이 희미하게 남겠지만, 진실은 그 밤에 묻혔다.
때론, 진실이다 주장하기보다
침묵이라는 이불을 덮어 진실이라 주장하지 못한 진실을 위로하며
그렇게 침묵 속에 잠들게 하는 것이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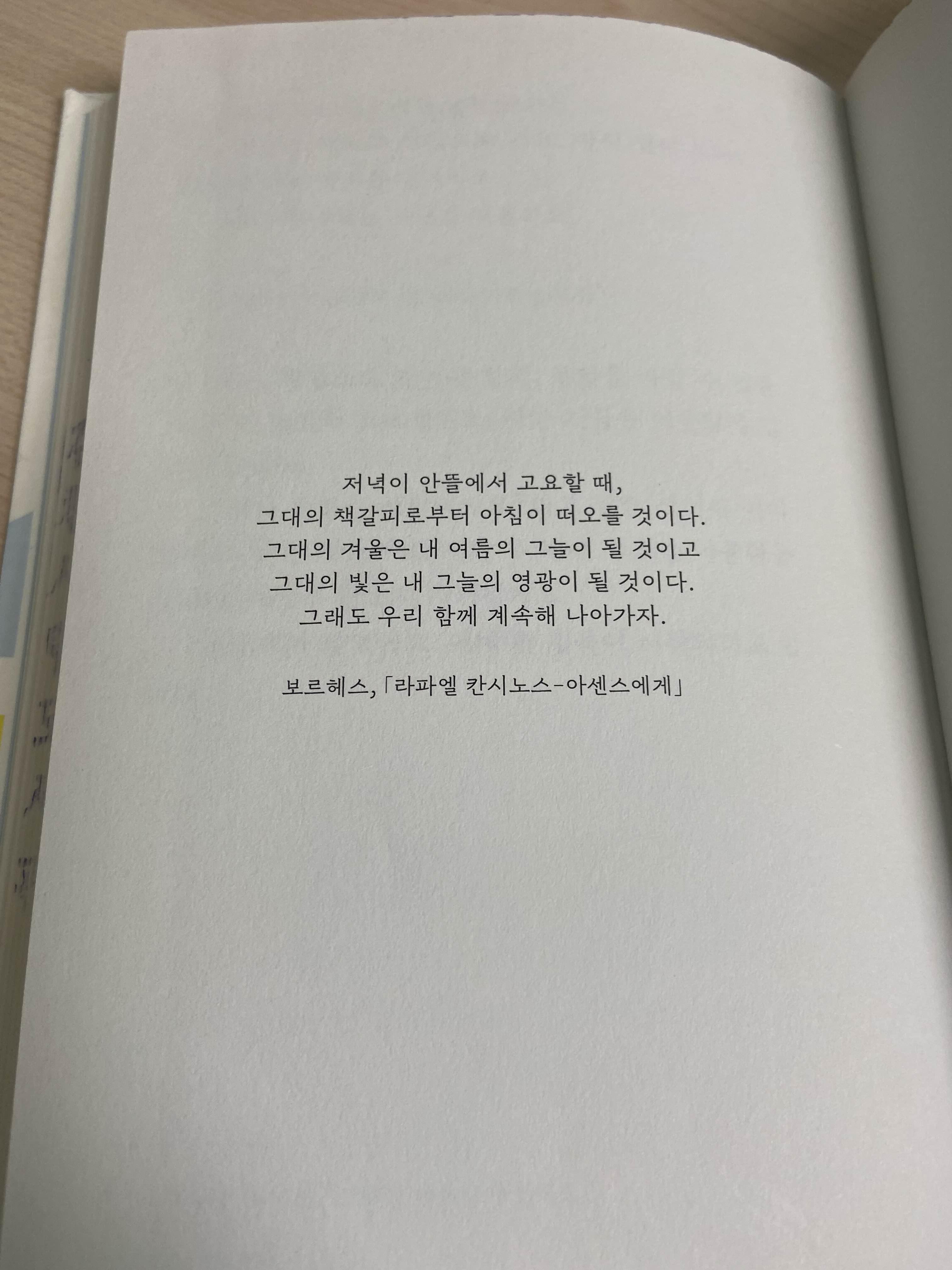
작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라는 말을 남기며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은 어찌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짧다라는 탄식은 어쩌면 봄꽃만을 바라보는데에서 생기지 않았느냐고,
벚꽃이 만발하는데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그걸 보면서 금방 여름이 오는 거 아니냐는 말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때만을 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2월 어느 날부터 새싹이 움트고 따뜻해진 바람을 알아채준다면..
도시의 건물 안에서는 감지 못할 봄의 단서들을 알아봐준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진 않을지요.
지나치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어요.
빌려온 4~5권의 책들 속에 가려 반납 일 전에 미쳐 펴보지도 못하고
반납 일 당일 못내 아쉬운 마음에 반납 전 도서관 책상에 앉아 빠르게 읽고 반납 할 요량이었죠.
몇 단락을 읽고는 다시 빌려서 천천히 음미해야 해야겠다는 생각이들었답니다.
과연 나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의미가 부여되어 곁에 두고 싶은 존재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날遇스토리:D > 책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추천 [철학이필요한시간] 작가_강신주 (5) | 2020.09.08 |
|---|---|
| 일기일회 법정스님 (6) | 2020.06.26 |
| 책 추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59) | 2020.05.28 |
| 책 추천 [당신이 옳다] 정혜선의 적정심리학 (38) | 2020.05.21 |
| 책 추천 [너라는 계절] 김지훈 (55) | 2020.05.14 |




댓글